‘CF100’은 상시 무탄소에너지 요구
높은 기준 탓 참여 기업 전 세계 9개뿐
원전 지키려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게티이미지 뱅크 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CF(무탄소) 100’ 추진 기구인 CFE포럼을 출범시키며,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RE(재생에너지)100은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CF100 전환’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관련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CF100이 RE100보다 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직 생소한 개념인 CF100의 정식 명칭은 ‘24/7 Carbon-Free 에너지’이다.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즉 상시 무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목표가 까다로워 CF100에 참여를 선언한 119개 기관 중 기업은 전 세계에서 9개에 불과하다. 구글은 이미 2017년 RE100을 달성했는데, 2020년에 “2030년까지 CF100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자, 과감한 결정에 전 세계가 주목했을 만큼 CF100은 난도가 높은 문제다.
반면 RE100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연간 단위로 측정하도록 융통성을 열어놓고 있다. 탄소 발생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납부해 그 돈을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프리미엄’이나,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인 REC를 구매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의 점진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이 빠르게 늘어나 전 세계 RE100 가입 기업 407개 중 한국 기업이 29개이다. 정부의 “RE100은 현실성이 없으니, CF100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은 “입문 문제가 어려우니, 심화 문제부터 풀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CF100 띄우기에 나선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RE100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지만, CF100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받는 것이 한국에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숨어있다.
우선 원전의 장거리 송전이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생기는 장거리 송전은 전력 낭비는 물론 통과지역 주민의 반대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17년간 이어진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 2년간 준공이 연기된 주요 송전ㆍ변전 시설이 전국에 19곳에 달한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민 저항까지 고려한다면 장거리 송전이 필수인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래서 친원전론자들은 소형모듈원전(SMR)에 매달리고 있다. 아직 미완성 기술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되어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단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공장 옆에 SMR를 지으려 하면,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까. 게다가 이미 포화상태인 원전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 건설은 언제 이뤄질 것인가. 많은 친원전론자들이 ‘원전은 100% 무탄소 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난제들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CF100 달성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의지는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RE100 대체용으로 CF100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면 심각한 판단오류가 아닐 수 없다.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단,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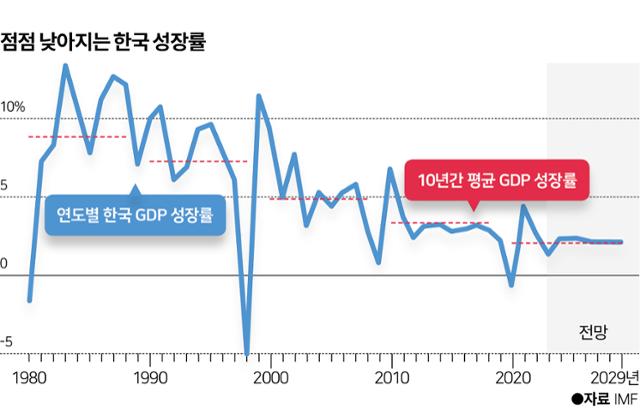
댓글 0